흑인으로 살아가는 게 여전히 참 어려운 미국
지난 5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이후 미 전역에서 이어진 대규모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지켜보면서 이래저래 착잡했다. 내가 이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1991년에도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의 인종차별로 미국 사회가 심한 갈등에 휩싸였었다.
당시 25살의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음주 운전 상태로 경찰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체포돼 백인 경찰들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했다. 폭력 행위에 가담한 경찰들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백인이 다수였던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에 분노한 흑인들은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를 일으켰고 당시 한인타운도 큰 피해를 봤다. 그런데 다시 찾아온 미국에서 또다시 흑인에 대한 경찰의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폭동과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 사회에서 흑인으로 살아가는 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힘겨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1619년 8월 영국의 아메리카 식민지 버지니아에 첫 흑인 노예 20여명이 발을 디딘 지 40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땅의 흑인들은 여전히 차별과 싸워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
지난 1년간 미국에서 지내면서 흑인 가족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시트콤 ‘블랙키시'(Black-ish)를 통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나고 자란 고향에서 차별받는 흑인들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시트콤 제목을 굳이 한국어로 옮기자면 ‘흑인스러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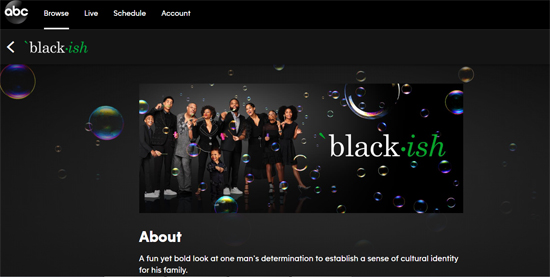
주인공인 중년 흑인 남성 안드레 존슨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중 한 곳으로 꼽히는 LA 남부의 흑인 빈민촌 컴턴 출신이다. 지금은 유명 광고회사의 임원으로 부촌에 거주하며 마취과 전문의인 아내와의 사이에 다섯 자녀를 둔 성공한 가장이다. 시트콤에서 안드레는 백인 중심의 미국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발을 들여놨지만, 여전히 흑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맞서 싸워야 한다. 빈민가에서 벗어나 백인들 틈에서 살면서 흑인도, 백인도 낯설게 느껴지는 자신의 모습에 죄책감을 느끼고, 부유한 가정에서 백인처럼 자라나는 자녀들이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그의 모습이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진지하게 그려진다.
인상적인 에피소드 몇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한 에피소드에서 주인공 안드레는 아내 대신 주민 모임에 참석했다가 만취한 백인 이웃 여성의 차를 대리 운전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곯아떨어진 이웃을 옆에 태우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저 멀리에서 검문을 벌이는 경찰을 발견하고는 여성과 차를 버려두고 그대로 줄행랑을 친다. 나중에 도망친 이유를 묻는 아내에게 그는 백인 경찰에게는 잠든 백인 여성의 차를 운전하는 흑인 남성은 차량 절도범이나 납치범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우연히 회사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고 있는 백인 여자아이와 마주친 안드레가 주위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이를 버려두고 황급히 자리를 피한다. 나중에 회의실에서 만난 안드레와 그의 흑인 동료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백인 꼬마와 단둘이 있을 뻔한 위기를 서로 어떻게 모면했는지 털어놓으며 가슴을 쓸어내린다. 우는 아이를 왜 혼자 두고 가버렸느냐는 백인 사장의 질문에 안드레는 흑인 남성이 백인 여자아이와 단둘이 있다가는 유괴범이나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한다.
물론 시트콤이라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과장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겠지만 플로이드처럼 죄 없는 흑인들이 백인 경찰의 과잉 진압에 목숨을 잃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 안드레의 이런 과민한 반응은 어쩌면 편견과 차별에 맞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아가는 이 땅의 흑인들에게 당연한 반응인지도 모르겠다.
그동안 운이 좋았는지 나는 지금껏 인종 차별을 당한 기억은 없다. 그렇지만 미국 곳곳에 여전히 유색 인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잘 안다. 더구나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온몸으로 인종차별주의를 실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는 숨어 지내던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그러나 더디기는 해도 미국 사회에서도 조금씩 변화는 일어나고 있는 듯하다. 1992년 LA 폭동이 흑인 위주로 펼쳐진 데 반해 올해 플로이드의 죽음으로 촉발된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구호 아래 흑인과 백인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될 수 있겠다.
아메리카 원주민 비하 명칭이라는 논란 속에 이미 30년 전부터 교체 요구를 받아온 워싱턴 D.C의 미국프로풋볼(NFL) 구단 워싱턴 레드스킨스는 시위와 광고주들의 압력에 굴복해 최근 팀명을 바꾸기로 했다. 연방정부의 공식 공휴일이 아닌 탓에 매년 흑인들끼리 지켜왔던 미국의 노예해방 기념일 ‘준틴스 데이'(Juneteenth Day·6월 19일) 행사가 올해는 미국 곳곳에서 펼쳐지기도 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이렇게 미국 사회에서 작은 변화들이 감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뿌리 깊은 편견과 인종주의를 떨쳐내는 데 얼마나 오랜 세월과 큰 노력이 필요한지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흑인들의 애환에 관심을 기울이고 미국 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주의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피부색, 국적, 문화가 다른 결혼 이민자와 이주 노동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우리 안부터 먼저 돌아봐야 할 때인 것 같다.
